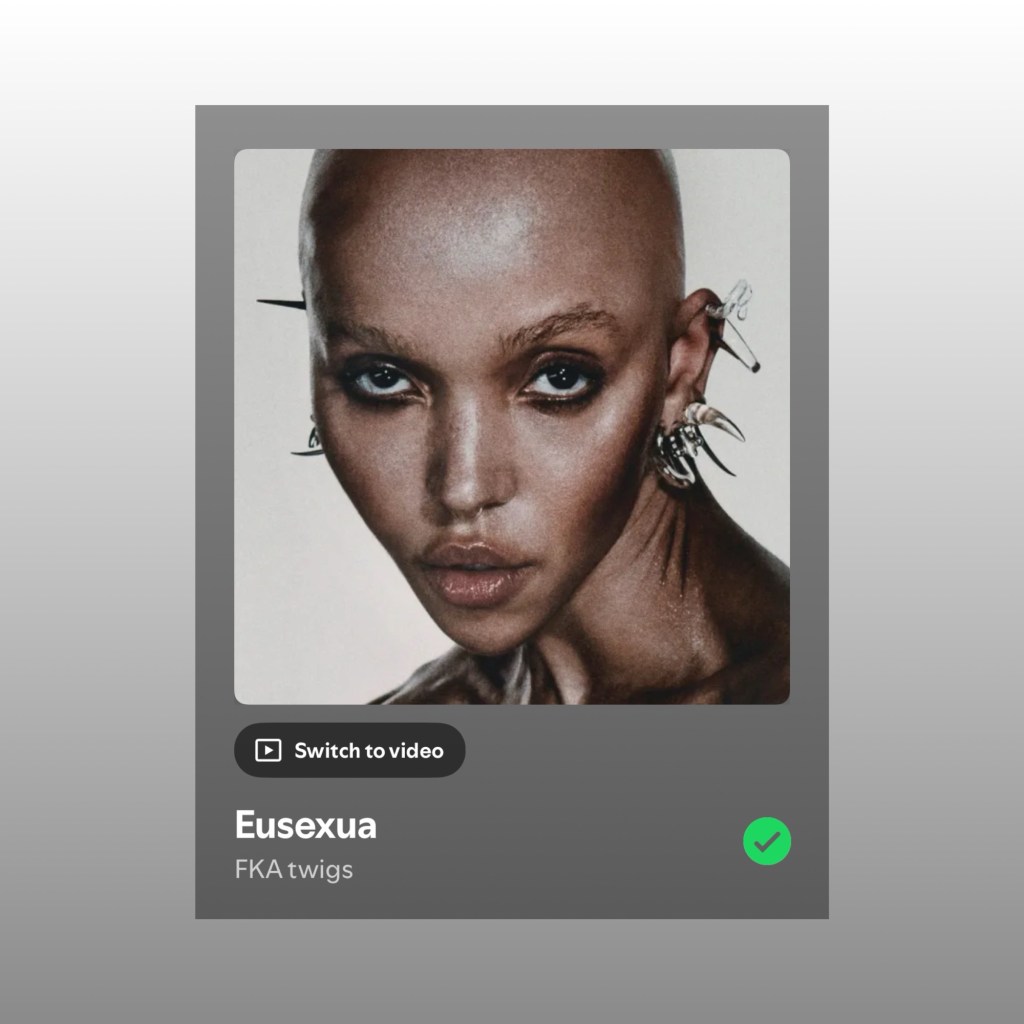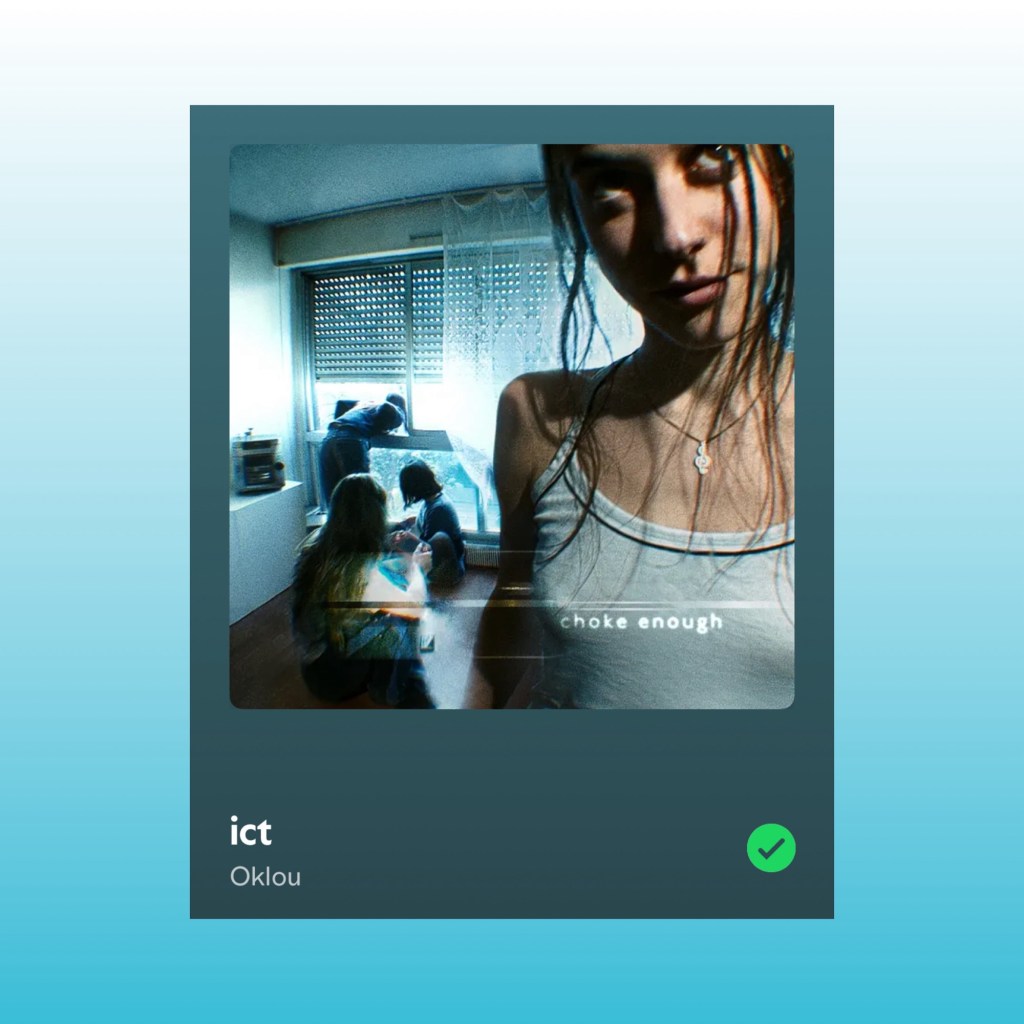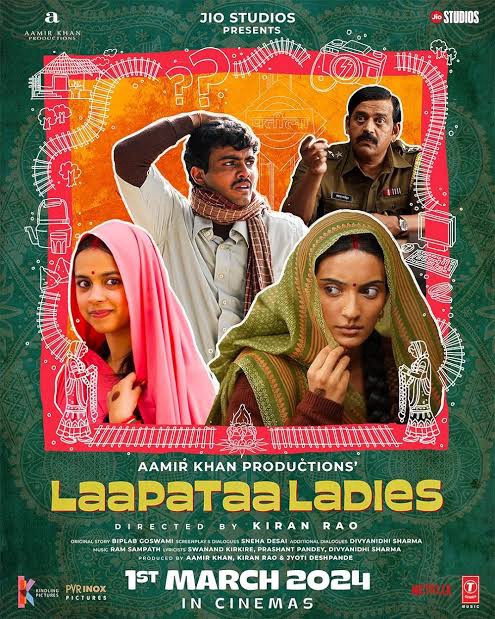타임라인에 별 설명 없이 ‘들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올라온 링크를 별 생각 없이 눌렀다. 약간의 싸이키델릭과 그런지. 향수를 자극하는 소리가 꽤 좋아서 곧바로 가장 최근에 발매된 정규앨범 정주행을 시작했다가 세 번째 트랙에서 벼락맞은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 락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찐따가 하는 음악이라고 답할 것 같다. 세상을 후드려 패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속 끓이는 찐따가 하는 음악이 락 아닌가요?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락 좋아함 ㅋㅋ
물론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락덕은 아니지만 .
락덕은 아니지만 ! 내게도 취향이 있다. 나는 말이 많은 게 싫다. 감정을 글로 서술하는 게 싫다. 기깔나게 뽑힌 멜로디 덕분에 운 좋게 묻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락 사운드에 긴 설명문 같은 가사를 얹은 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다. 아 장르 바꾸시라고요. 소리로 말하라고요. 구질구질한 일기는 나도 매일 쓴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곡들은 대체로 말수가 적다. 보컬과 가사는 구심점이 되어줄 뿐, 소리가 대신 말하도록 양보하는 곡이 좋다. 아픔을 설명하지 않고 소리로 휘어잡아 냅다 자기 상처로 끌어당기는 곡들이 좋다. 한 번 상처로 들어가면 끓는 감정의 ‘이유’는 두루뭉술하게 흐려지는데, 그 가운데서 같이 발 구르고 팔 젓고 터지고 흐르는 순간이 좋다. 그리고 운더홀스의 노래를 들을 때 저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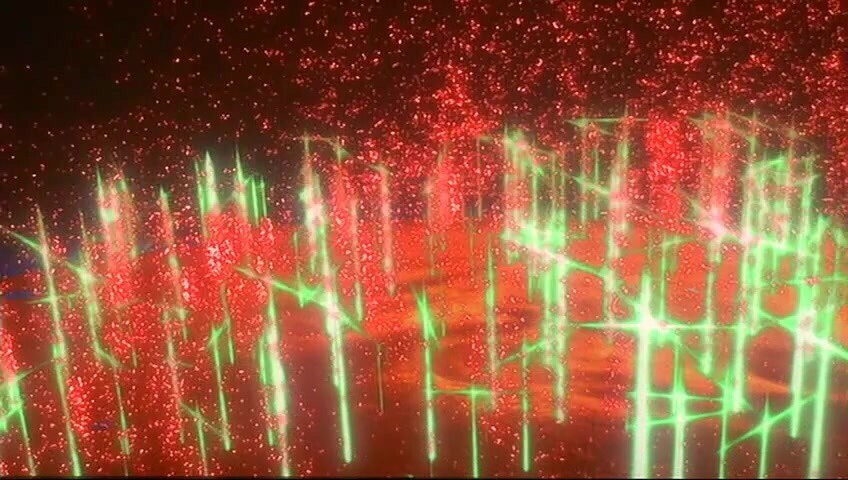

멜로디나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운더홀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가사같다. 첫 마디만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 번째 트랙을 살펴보면요.
I, I don’t wanna be remembered.
But I don’t wanna be forgot.
I don’t wanna be forgot.
굳이 기억되고 싶진 않지만 잊혀지는 건 싫다는 찌질한 고백이 단조롭지만 멜랑콜리한 기타리프 위에 읊어질 때… 항복.
허겁지겁 곡명을 확인하니 제목이 ‘Atlantis’ 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틀란티스가 부르는 노래란 거죠. 바다 바닥에 가라앉은 도시가 수면을 향해 띄워 보내는 말인거죠. 🥹
역시나 잔잔하고 대수롭잖게 시작하는 여덟번 째 트랙 Mantis (사마귀)도 보자.
Did it move?
(저거 움직였어?)
Did I move you?
(내가 너 건드렸니?)
Was there feeling?
(뭔갈 느끼긴 했을까?)
It felt so real
(너무 생생했어…)
사마귀라는 제목과 ‘저거’ 움직였냐는 첫 마디 에서부터 듣는 사람을 사마귀로 만들어 버리네. 나 지금 배가 밟혀 바닥에 붙어 꼼짝없이 죽어가는 사마귀야..
‘너무 아파.. 그치만 그게 너지, 그냥 밟아버리는 거, 그게 아름다운 너지.’ 그리고 끊어질 듯 말듯한 가성으로 한숨 같은 저주를 토해낸다. ‘널 완전히 두렵게 하는 걸 만났을 때, 그게 약한 너를 차 버릴때, 그게 진짜 사랑이길 바라’
그러고 사마귀는 죽는다. 🥲
그러고 나면 그때껏 잔잔하던 사운드가 바람처럼 휘몰아치는데, 소용돌이 가운데서 마음 겨눌 방향을 잃고 힘들어진다.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넘치는 상처 폭탄 돌리기. 사마귀를 밟은 사람도 언젠가는 사마귀가 되고, 사마귀도 언젠가는 발이 되어 남을 밟게 되는 돌려돌려 돌림판을 두고 노래가 그런다. ‘아름다운 세상이야. 진짜 아름답지.’
곡 명이 뇌리에 박힐 수 밖에 없도록 쓴 가사와 간결한 비유로 청자를 즉각 소환하는 능력이 탁월하시네요. 문학적이란 생각도 든다. 이 밴드를 알게 됐을 때 읽고 있던 이미상의 <이중작가초롱>에서 ‘제목이란 없으면 글의 반 토막이 날아갈 정도로 결정적이어야 합니다.’ 라는 구절을 봤을 때 운더홀스를 떠올린 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락덕은 아니지만 ! 공연장에서 함께 감정을 터트리고 흔들릴 수 있는 것도 락의 멋진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일 좋았던 곡은 2번 트랙 Purple 이다.
Green eyes cryin’ at the door, Long nights pacin’ the kitchen floor.
(녹색 눈이 문가에서 울어요. 긴 밤이 부엌 바닥을 왔다갔다 해요.)
This house if half crazy. Dad’s always drinkin’
(이 집은 반쯤 미쳤어요. 아빠는 항상 술을 마시고)
Nobody’s listenin’ and no one seems to care and there’s nowhere I can go. (아무도 듣질 않고 신경쓰는 것 같지도 않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어요.)
And she dreams purple and anger and roses explodin’ in circles around her grow louder.
(그녀는 보라색과 분노를 꿈꾸죠. 주위를 장미들이 원을 그리며 폭발해가는 꿈을.)
And nobody’s noticed the gun at her temple.
(그리고 그녀의 사당에 총이 감춰져 있단 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해요.)
Hey, Scarlet, you don’t need to be lonely tonight. There’s a home for you here in my heart.
(스칼렛, 오늘 밤은 혼자일 필요 없어요. 여기 내 맘속에 당신을 위한 집이 있어요)
초록과 보라. 멍의 색깔로 시작해 스칼렛(주홍색)을 호명하며 ‘네 안에 숨겨진 총을 알아. 네가 꿈꾸는 분노를 알아.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손 내미는 이 곡을 라이브 영상으로 찾아본 밤에 한참을 엉엉 울었다. 어떤 곡들은 콘서트를 한 번 거쳐야만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비로소 진짜 태어나게 되는 듯.
근데, Purple 을 듣고 나니 이 그룹에 대해 인간적인 호기심이 생겨난 거라. 전부 남자인 그룹인데 가정 폭력을 당하는 여성에 대한 곡을 부르면 아무래도 좀 궁금해지죠.
Wunderhorse는 프런트맨 제이콥 슬레이터 (Jacob Slater)의 프로젝트성 밴드로 시작했단다. 제이콥은 열 일곱 살에 혼자 집을 떠나 런던으로 상경했고, 5년 동안 Dead Pretties 라는 펑크밴드의 프런트맨으로 활동했다고. 암만 영국이래도 열 일곱에 혼자 상경해 펑크 밴드 프런트 맨을 했다니 가슴에 할 말이 많이 쌓인 삶이긴 했던 것 같다.. 스칼렛은 누구였을까.
하지만 제이콥은 런던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에 늘 펍에 있긴 했는데, 무대를 잘 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더군다나 2017년에 밴드가 해체된 뒤 제이콥은 약물에 의존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콘월로 내려가 막노동과 서핑강사 투잡을 뛰며 음악을 썼다고.
“창의력은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음악 외의 것들에도 관심을 가질 때 생겨요. 그리고 그걸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서핑이죠. (아이디어가 고갈돼)음악 커리어가 끝난 것 같다? 서핑 하러 가세요.” (NME와의 인터뷰 중)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 곡을 썼다는 게 너무 좋다. 노래의 힘이 다 거기서 왔나봐. 그가 쓴 곡 속의 화자들은 감정을 터트리고 아파하면서도 혼자 부르짖지 않고 늘 손을 내밀거나 이어폰 너머의 귀에 직접 말을 건다.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끝이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구.. 그런 힘.
어쨌든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Wunderhorse 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1인 프로젝트 밴드는 드러머(Jamie Staples), 기타리스트(Harry Fowler), 베이시스트(Pete Woodin)가 차례로 합류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데뷔 앨범인 <Cub>는 발매되자마자 호평을 받으며 2022년도 NME, Riot, Far Out 이 꼽은 ‘올해의 앨범’ 리스트에 선정됐다.
제이콥은 2023년 솔로앨범 도 냈는데, 어쿠스틱 장르이지만 멜랑콜리한 멜로디와 마음에 물자국 남기는 가사는 운더홀스 곡들이랑 비슷하다.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당연하지)

어쿠스틱 기타에 부옇게 피어오르는 목소리가 멋지다. 솔로앨범에서의 제 추천곡은요, Blue Lullabies와 Dead Submarines.
여튼, 며칠간 하루에 백 번씩 바다 속에 가라앉은 아틀란티스가 됐다가 뙤약볕에 죽어가는 사마귀가 됐다 척추에 파랑 나비 타투를 새기고 수면 위로 뛰어드는 사람이었다가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뛸 곡 없이 반복해 들을 수 있는 앨범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
모쪼록 인기를 잘 모아서 정규 앨범을 둘만 더 내줬으면 좋겠다. 🥹 그리고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는 게 조금 웃기지만 운더홀슨지 원더홀스인지 분더홀스인지 맞는 발음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제발) 그리고 언젠가 꼭 공연을 볼 수 있길🥹🤍
마지막 곡으로 제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줬던 Epilogue 를 띄웁니다.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