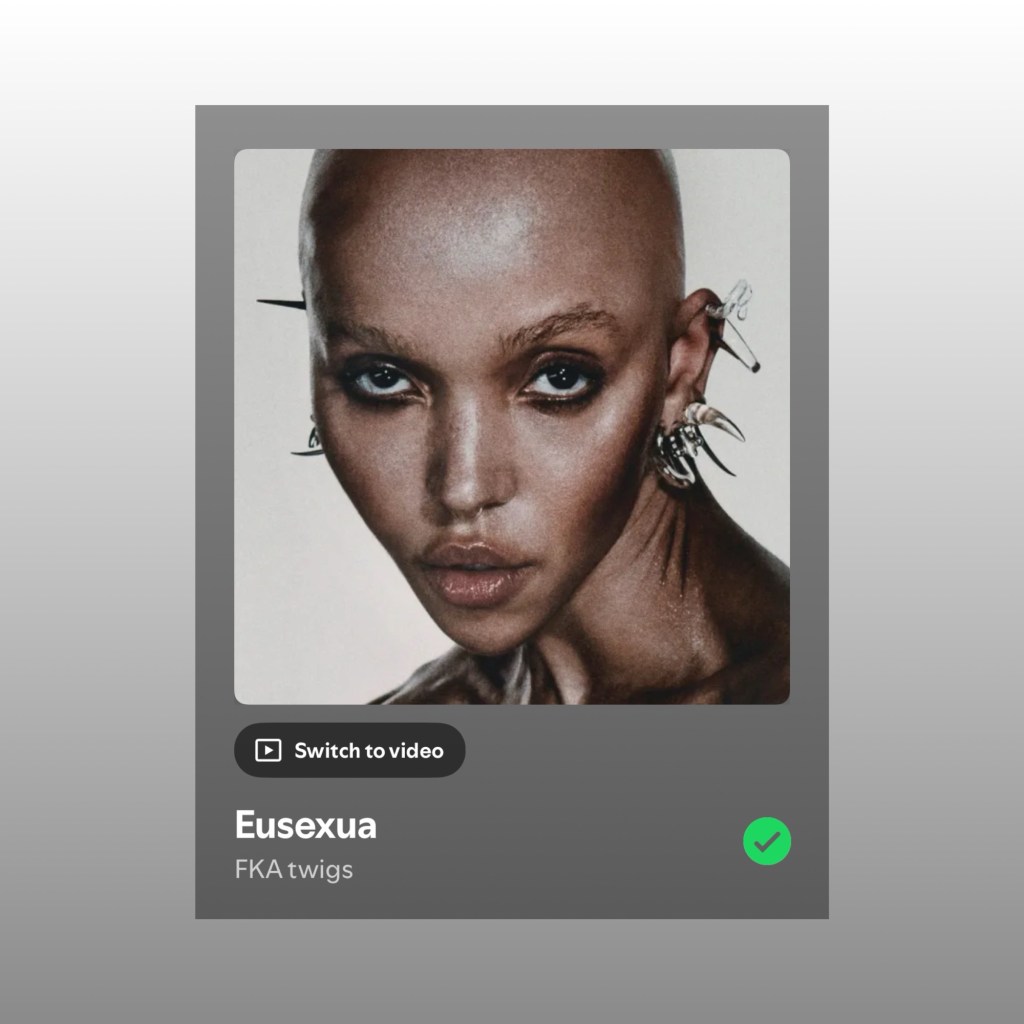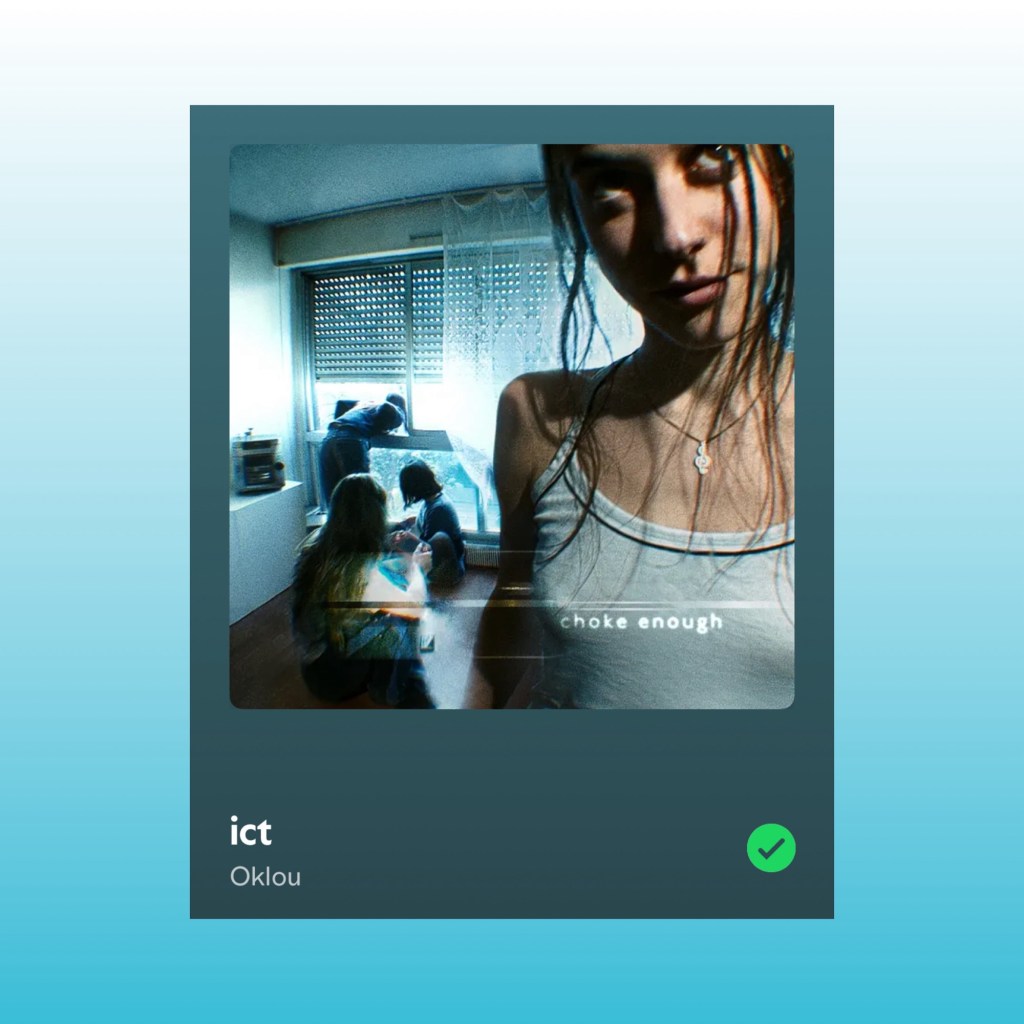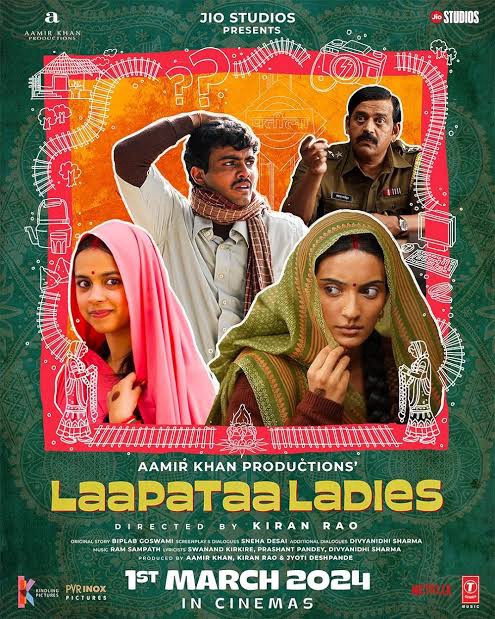오렌지디 부당해고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고, 리디 못쓰겠다 싶어 이용 끊은지 몇 달 됐는데, 리디에서만 출간한다는 거예요.. 찝찝한 마음으로 구매.
도쿄에서 박사과정 밟는 중인 나는 애인이 가 있는 캐나다로 이사를 결심한 상태다. 이사를 결심한 이유는 애인을 만지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만지고 깨물고 실제로 고기를 씹는 것처럼 힘을주어 깨물어서 팔과 어깨에 이 자국을 내고싶고.(…) 반대로 너 역시 나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날, 같은 연구실 동료의 친구인 ‘아미’를 만나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다 그 역시 상하이에 있는 애인과 장거리 연애중이라는 걸 알게 된다. 아미가 말한다.
결국 자주 만지고 싶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 상대방과 나를 결국 두사람을 가끔 묶어두고 싶은 것 같아요. 잠깐 붙어있게 묶어두고 싶지만 단단히 묶는 건 조금 무서우니까 어느 정도의 점성으로만 묶어두는 거예요. 맘 먹고 힘주면 풀리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만지고 싶고 붙이고 싶다는 마음을 잘 접고 뭉쳐서 실험실 책상에 두고 이 물질을 만들어서 먹이고 붙이고 문질러 보자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평범하게 손을 뻗는 것이 빠르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조립한다고 해야하나. 채워나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감각으로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나에게는 흡수되듯이 이해가 되었는데 나 역시 상대를 만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이 내가 실제로 무언가를 한 것과 그것을 복기하는 것과 복기한 것을 변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각 역시 당시에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생생했다. (…중략…) 애인이 아니라 아미를 만지고 이 정도의 끈적함 이 정도의 붙어있음을 점액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강렬한 성욕에 휩싸인채 깨는 날도 드물어졌다. 캐나다로 옮길 몸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그날 잠에서 깬 아침에 짧은 손가락을 보면서 말했다.
너무 좋아.
어떤 상황에서의 태도가 비슷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불쑥 튀어나가 버리는 반가움과 고갤 쳐드는 이름 모를 감정. 그런 마음과 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어떤 부분을 영영 바꾸어버리기도 하는 신기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나는 읽었다.
멀리 떨어진 곳의 애인을 만지고 물고 고기를 씹듯 씹어보고, 또 상대도 나를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애인을 사랑한다기보단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지독히 외롭다는 뜻일 것이다. 그걸 위해 나는 캐나다행을 감행하고, 아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일 수 있는 물질을 연구한다. (그리고 그게 미역이었다는 설정이 너무 이상하고 좋다.) 나와 아미 모두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는 여기지만, 외로움에 밀리진 않는다. 오히려, 남을 내게로 붙이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밀어붙여 바다를 건너 사는 곳을 옮길 준비를 하고, 세상에 없는 물질을 연구하고, 남이 건넨 미역을 먹어버린다.
앙.
나는 박솔뫼 소설 속 인물들이 너무 좋다.. 그 가뿐한 씩씩함과, 음식을 냠냠 먹는 차분하고 강한 에너지가.
뒷 부분의 전개는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곰곰 생각해보면 남을 옆에 붙이고 싶었던 사람들끼리 지금 여기에서 만난 거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 오간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퉁치고 싶진 않다. 애정과 호감, 그리고 욕망이 얽혀 만들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중 하나를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한다. 똑바로 바라보면 안 보이지만 적당히 주변부를 곁눈질하며 훑어야만 그 모양과 밝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밤하늘의 작은 별 같은, 이런 관계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있다면 어땠을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설을 읽게 되는 거겠지.
끝까지 읽은 다음엔 ‘현재’ 시점인 소설의 첫부분으로 곧장 돌아와 다시 읽었는데,
미역이라는 것을 알게된지 미역이 우리에게 찾아온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미역을 알고 즐겨먹었던 것처럼 여기게 되었고 한편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나는 늘 그런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매번 새삼스럽게 알아간다.
나는 아미를 사실은 실제로 만나기 전부터 그보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시간에 나는 처음 만나게 될 사람이 결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것도 언젠가부터 이해하게 되었다.
끝나자마자 맨 처음을 다시 읽게 만든 것도, 그랬을 때 처음 읽었을 때랑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히는 것도 넘 좋고. 그리고 이 문장들이 내가 박솔뫼의 글을 읽을 때 매번 느끼는 것인 점도 좋았다.
나의 삶에서도 산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즉시 휘발되는 생각들, 트집 잡듯이 포착했다가도 금방 놔주고 잊어버린 장면들을 박솔뫼의 글에서 다시 만날 때가 나는 너무너무 반갑고. 그렇게 처음 만났지만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반가운 글이었다.
+ 마지막으로 좋았던 부분 추가
나는 아미가 늘 어딘가 상당히 간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 군더더기가 없고 담백했는데 그걸 그때는 재미있는 사람으로 정리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누군가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의미였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