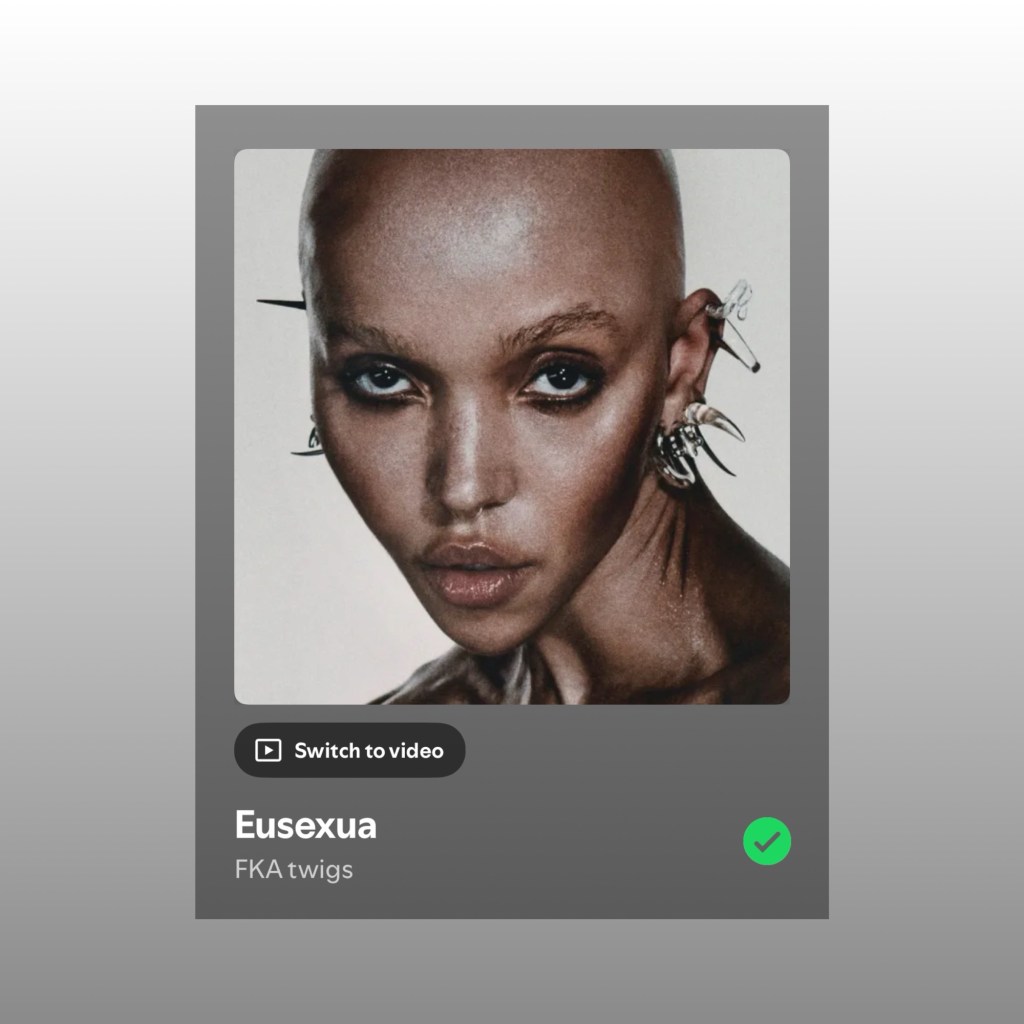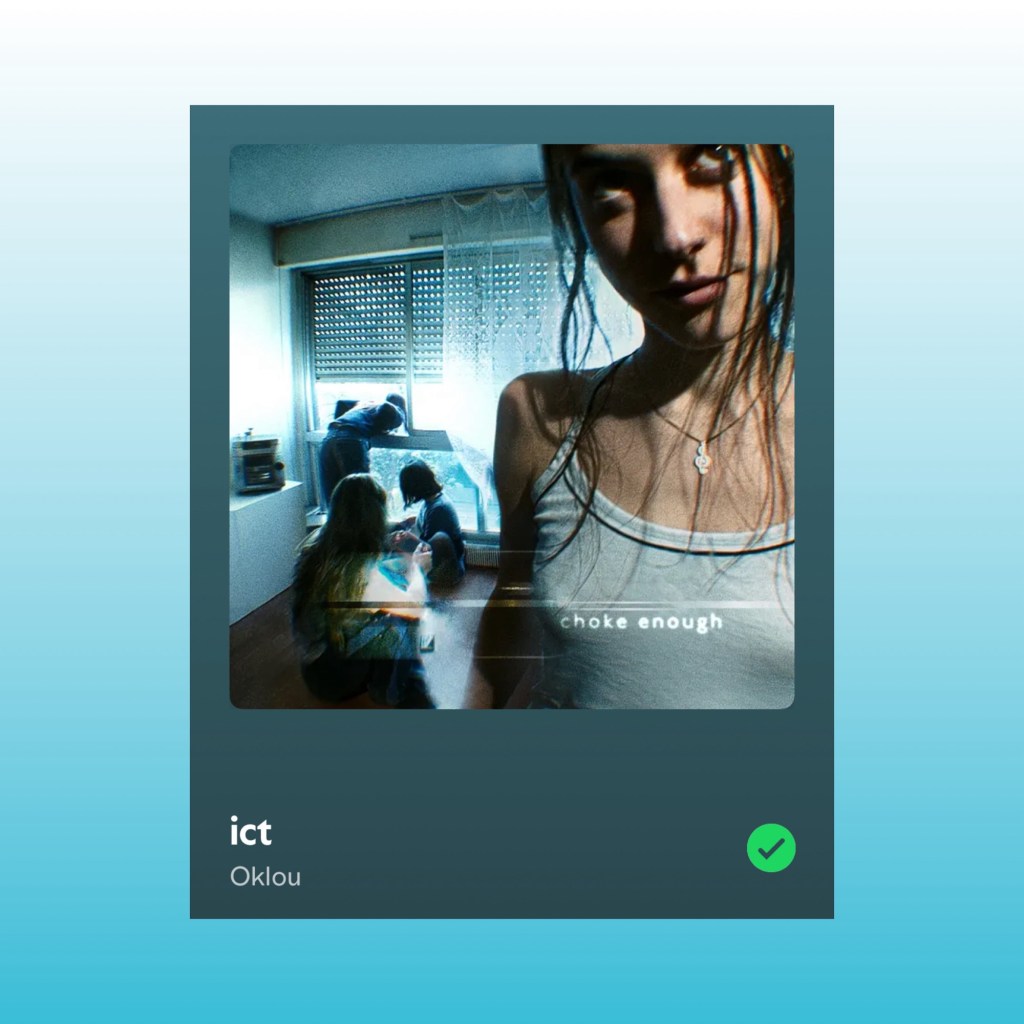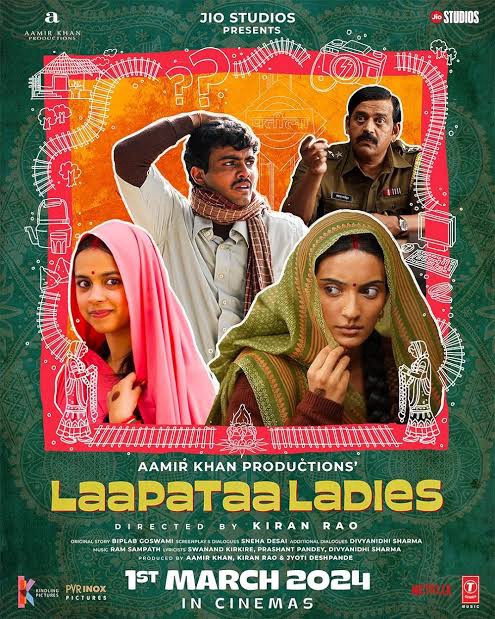작년보다 이르게 시작한 몬순이 석 달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한 계절이다. 구름 사이로 해가 잠깐 얼굴을 비추는 아침을 제외하곤 내내 흐리고 으슬으슬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늦은 오후 4시쯤 여지없이 비를 쏟아낸다. 컨디션이 괜찮은 날이면 이런 반복도 제법 낭만적인 일로 느껴진다. 매일 아침 서쪽 해안에서 태어나 산맥을 따라 1100m를 올라온 비구름과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거야. 만남의 순간 비구름은 죽지만 틀림 없이 내일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비슷한 시간에 또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우울한 날이면 헝거 게임 속 구역에 갇힌 기분이 든다.
어쨌든 매일 비가 오는데도 제습기는 커녕 선풍기조차 필요 없는 온도와 습도에는 감사하고 있다. 활짝 열어둔 거실 창으로 쌀쌀한 공기가 불어오면 물을 끓이지요. 기모 맨투맨 차림에 뜨끈한 문향배를 쥐고 청향 우롱의 향이 주는 행복을 누리지요. 향이 고인 깊은 잔에 코를 박고 향을 맡으며 금훤우롱, 취록우롱, 리산우롱 1400m, 1800m, 찻잎이 태어난 고도를 더듬어 올라가지요. 솜이불처럼 아리산 봉우리들을 누르고 타넘던 두꺼운 구름을 떠올리지요. 생의 대부분을 그늘 아래에서 습기를 먹고 자란 어린 잎에서 기가 막힌 향이 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차를 마시는 일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해. 하지만 어떤 생각에 자리를 잠시 내어주든, 작은 초콜렛 조각과 함께 차를 홀짝이다 보면 마음에 따뜻한 온점만이 남는다.
오사카 사람은 웃기다는 통설처럼 벵갈루루 사람은 허구헌날 날씨 자랑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나도 벵갈루루 사람이 다 된 것 같다.